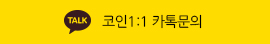자기희생없이 최고권력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아니, 내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취임 석 달 만에 지지율이 임기 말에도 나오기 힘든 20%대인가. 안보 경제 민생 위기를 부른 것도, 누구처럼 국정농단 사태를 자초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외교·안보는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경제는 마차가 말을 끄는 전 정부의 정책을 경제논리에 맞게 정상화하고 있지 않은가. 막말로 내가 처음부터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 수 있나.’
국익을 증진하기는커녕 해치는 국정 운영을 하고도 지지율 40% 안팎을 유지한 전임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면 서운함은 배가할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그런 억울함과 서운함만이 있다면 전임자와 자신에 대한 지지의 속성 차이와 권력의 생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말이 상징하듯, 무비판적 팬덤이 본류(本流)다. 지지자들은 한국 사회의 보수 주류세력과 싸워온 문재인에게 자신을 투사(投射)하며 심리적 동질감을 느낀다. 그러니 뭘 해도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다. 물론 정치인에게 무비판적 팬덤은 건강한 지지가 아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지지 대상을 이재명으로 갈아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현상이 재연되고 있어서 걱정스럽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선 비판적 지지가 본류다. 문재인-이재명으로 좌파 포퓰리즘 독재가 이어지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 합리적 중도·보수층이 그 고리를 끊을 대표선수로 윤석열을 차출한 것이다. 대선 당시 그 역할을 맡기에 가장 적격이어서 그를 택한 것이지, 정권교체만 이룰 수 있다면 윤석열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었다. 그러니 문 정권 5년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니’에 질릴 대로 질린 중도·보수층은 윤 대통령에게 반대로 말하고 싶은 것이다. “여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애석하게도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대선 전부터 ‘검찰공화국’ 우려와 김건희 여사 주변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검찰 식구’와 학교 동문을 중용하고,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며, 김건희 여사 주변 문제가 아직도 툭툭 터져 나올 정도로 방치한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윤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회의감에 빠뜨리는 것이다.
국민은 치자(治者)에게 자신을 다스릴 권력을 주는 대신 권력자도 자신의 것을 내놓기를 바란다. 그것은 자기희생이다. 윤 대통령은 그런 자기희생 없이 정치 참여 선언 9개월여 만에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다. 그것이 윤 대통령 권력의 태생적 약점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크든 작든 자기희생과 헌신의 스토리가 있다. 김영삼 김대중은 민주화의 거인, 노무현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분투한 ‘바보 노무현’의 신화가 있다. 이명박은 청계천을 복원해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공적인 기여가, 박근혜는 부모를 모두 총격으로 잃은 희생의 시간이, 문재인은 인권변호사로 살아낸 시절이 있었다.
윤 대통령에겐 무슨 자기희생이 있었나. 사법시험 9수를 했다지만, 그 당시 수험생활을 9수까지 밀어줄 집안이 얼마나 됐을까.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됐다고는 하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전국적 지명도를 얻지 않았나.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된 뒤 산 권력과 맞붙은 건 자기희생이라기보다는 성공신화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