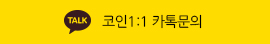노랑봉투법
하청 노조의 51일 파업에서 보듯이 시설과 건조 능력과 달리 경영과 노사 관계에선 아쉬운 대목이 적잖다. 최근 10년 사이 누적 순손실이 7조7446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2000년부터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인 산업은행을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 등이 11조8000억 원이다. 그 민낯이 하청업체 노조의 사상 첫 장기 파업이다.
공권력 투입이란 극단적인 상황을 피했다곤 하나 결말이 깔끔하지 않다. 찜찜한 봉합이다. 임금 30% 임상을 요구한 노조는 4.5% 인상안에 도장을 찍었다. 협력사는 51일 장기파업의 부담을 떠안게 됐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8000억 원대 손실을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문제는 이제부터 풀어야 할 실타래가 만만찮다는 점이다.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의 사법 처리와 원청 손실 처리 여부다. 파업 후유증을 극복하고자 휴가를 반납한 채 작업 중이지만 ‘법대로’ 돌아가는 상황은 노조에 큰 짐이다.
어제 대우조선해양과 이번 파업의 후폭풍을 가늠할 뉴스가 전해졌다. 우선 대우조선해양 분리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언급과 대우조선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의 반발이다. 강 회장은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이란 틀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조는 “구성원의 이해와 동의 없이 절대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발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금속노조는 “손해배상 가압류의 노동 탄압을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남겼으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 입장에 힘입은 바 큰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