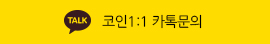탈모에 관한 숱한 의문과 뜻밖의 해결책들.
할아버지의 머리숱은 듬성듬성한데, 아버지는 무성하다. 피를 타고 유전된 ‘탈모’에도 볕 들 구멍이 있다. 탈모는 유전적 토대에 환경적 요인이 보태져 생긴다. 노력에 따라 탈모 유전자가 있어도 머리가 벗겨지지 않을 수 있단 뜻이다. 모계나 부계에 탈모인이 있다고 절망하긴 이르다. 지금부터 관리하는 사람이 승자다.
◇탈모 예방엔 미네랄·비타민… 탈모약은 ‘굳이?’
탈모 가족력이 있다면 모발을 지킬 수 있는 생활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머리 감을 땐 샴푸를 5분 이내로 씻어내고, 찬바람으로 두피 속까지 꼼꼼히 말려야 한다. 모발과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탈모 예방의 첫걸음이다. 술·담배도 끊는다. 흡연과 음주가 탈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철분 ▲아연 ▲셀레늄 등 미네랄과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도 좋다. 매일 철분을 150~200mg 먹으면 안드로겐 탈모가, 아연을 5mg/kg씩 먹으면 원형탈모가 예방 또는 완화된단 연구 결과가 있다. 항산화 물질인 셀레늄은 모낭을 보호해 모발이 잘 자라게 한다. 비타민 B7인 ‘비오틴’은 모발의 약 90%를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해준다. 이외에도 ▲양파즙 ▲로즈마리 오일 ▲사과즙에서 추출한 프로시아니딘 B2 ▲마늘성분 겔 등을 두피에 바르는 게 탈모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졌다.
탈모 가족력이 있다고 일찌감치 탈모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 약의 작용 원리상 탈모 예방에 보탬이 되리라고 추측되나, 아직 임상연구가 진행된 적 없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또 탈모약을 복용하면 드물게 발기부전·성욕 감소·사정장애 등 성 기능 장애나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머리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며 약을 먹진 않아도 된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탈모가 발생하지 않았을 땐 영양보충 등의 보조적 요법을 시행하며 경과를 관찰하라”며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할 때 약물 복용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탈모 기미 보인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원인’ 진단
탈모 가족력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탈모 자가진단을 해보는 게 좋다.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탈모가 의심된다. ▲친가·외가·형제 중에 탈모인이 있다 ▲헤어라인이 후퇴하며 이마가 넓어진다 ▲전두부와 정수리 부위 모발이 가늘어진다 ▲모발 10여 개를 잡아당겼을 때 4~6개가 빠지고 머리카락이 잘 끊어진다 ▲비듬이 늘고 머리가 자주 가렵다 ▲두피에 기름기·부스럼·딱지가 자주 생기고, 열이나 땀이 많아진다 ▲탈모 유발 호르몬 탓에 음모·수염·코털을 비롯한 체모가 굵어진다.
이미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면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병원을 찾아 탈모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원인과 유형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서다. 탈모 초기에 조처를 할수록 다시 자란 머리칼도 더 건강하다. 머리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10만 원대 탈모 유전자검사? ‘필수’는 아냐
최근엔 약 10만 원에 내게 있는 탈모 유전인자를 알아볼 수 있다. 건강검진 센터나 탈모 전문병원에서 신청하는 ‘탈모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다. 비대면 검사도 신청할 수 있다. 유전자검사 키트를 집으로 배송받은 후, 검체를 스스로 채취해 전문 분석 기관에 부치면 끝이다. 분석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된다.
내가 탈모 유전자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알면 자연스레 탈모 예방에 힘쓰게 된다. 다만, 유전자검사의 효용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서 그친다. 본인에게 어떤 탈모 유전인자가 있는지 개인이 안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이 달라지진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유전성 탈모 위험군인지는 탈모 가족력만 봐도 알 수 있다. 굳이 검사를 받을 필요까진 없단 것이다.
유전자 검사 신뢰도가 계속 높아지곤 있지만, 아직까진 유전자 검사로 유전성 탈모 발생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탈모가 어떻게 유전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탈모 유전자가 있다고 무조건 머리가 벗겨지는 것도 아니어서다.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적 요인도 고려한다면, 탈모가 정말 발병할지,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느 정도 진행될지를 검사만으로 알긴 어렵다.
김범준 교수는 “탈모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보단, 머리카락이 점차 빠지고 있는지 평소에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탈모 진단과 치료에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